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삼계탕 맛집을 찾아보자~~
한 그릇 먹고나면 잃어버진 기력이 불끈 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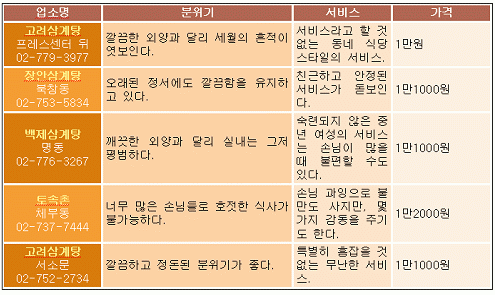
원래 ‘계삼탕’이라 불렀다는(요즘은 인삼을 맛보기로 넣는 수준이니 닭이 앞에 있어야 맞긴 맞는 것 같다) 삼계탕은 복날 최고의 음식이다. 보신탕은 못 먹는 이도 많고, 값도 만만찮아 손톱만 한 인삼이나마 대추와 함께 넣고 푹 고듯이 끓이는 삼계탕이야말로 땀 많이 흘리는 여름철의 맞춤 보양식이다.
하기야 요즘처럼 단백질과 지방 과잉 시대에 특별히 여름이라고 땀 흘리며 보양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만, 그래도 일종의 심리 효과만이라도 내주는 보양식을 한 그릇 해야 여름을 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삼계탕을 여름에 먹게 된 것은 닭의 성장과도 관계가 있다. 봄에 부화한 닭이 서너 달 지나면 고아 먹기에 딱 알맞은 어린 닭(영계)이 되는 까닭이다. 이러던 것이 요즘은 배합 사료에 뭘 넣었는지 한 달도 안 되어 삼계용 닭으로 자란다. 그래서 닭의 성장 속도와 여름철의 삼계탕 붐은 현대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사족이지만, 자연 상태에서 20년을 산다는 닭의 수명이 2~3년도 못 사는, 요즘의 초고속 사육 기술은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삼계탕은 국물 음식이다. 같은 국물 음식이라도 설렁탕은 뼈와 고기의 질과 배합이 맛을 가름하기 때문에 손맛을 타지만, 삼계탕은 손맛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소복하게 끓여 깍두기 하나만 잘 곁들이면 된다. 그러나 취재팀은 취재를 하면서 삼계탕도 끓이는 솜씨가 다 달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름 음식은 위생이 중요하다. 한때 압구정동의 유명 삼계탕집 뒤뜰에 마구잡이로 쌓아놓은 닭을 본 후로 입맛이 싹 가셨던 경험이 있던 터라 유별나게 위생 문제를 눈여겨보았다. 주방은 모두 폐쇄식으로, 문틈 사이로 슬쩍 들여다보이는 상태는 대부분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 주방이 좁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펄펄 끓여내는 음식이라도 장마까지 겹친 한여름에 문제가 없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시청 프레스센터 뒤쪽에 자리한 ‘고려삼계탕’은 서소문의 고려삼계탕과 같은 상호를 쓰는데, 국물은 그다지 진하지 않고 담박해서 좋은 편이고, 화학조미료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가격도 무난한 편(1만원). 그러나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미리 삶아서 건져두게 마련인 닭을 펄펄 끓는 국물에 넣고 한 번 더 끓여내는데, 충분히 끓이지 않아 닭 속의 찹쌀 소가 미지근했다.
인삼도 너무 작아서 불만을 사기 쉬울 듯. 살짝 들여다보이는 부엌 바닥은 타일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뚝배기가 그대로 쌓여 있어 보기 좋지 않았다. 여기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취재팀에게 ‘기계를 다룰 줄 모른다’며 5분을 기다리게 하다가 결국 간이영수증만을 끊어주었다. 오래 된 집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소한 서비스에서 실망을 안겨주었다.
게다가 손님이 적은 시간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선지 에어컨이 잠자고 있어 안 그래도 더운 음식을 땀깨나 흘리며 먹어야 했다. 불만 없는 맛인데, 위생과 서비스에서 결함을 드러냈다. 요즘 소비자 운동이 어느 때보다 왕성하고 위생을 따지는 꼼꼼한 손님이 많은 터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업소다.
북창동의 ‘장안삼계탕’은 리노베이션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그런대로 깔끔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음식 맛도 전통 삼계탕의 맑은 국물과 쫀득한 고기 맛이 괜찮았다. 깍두기도 합격점. 그저 소박하게, 정성 들여 닭 누린내를 제거하고 담박하게 끓이면 되는 음식인 삼계탕의 전형을 잘 지키는 집이다.
명동의 ‘백제삼계탕’은 일본인 손님이 많이 보인다. 일본 잡지에 실린 기사 스크랩이 실내에 붙어 있다. 이 집의 삼계탕은 찹쌀 국물이 흐벅지게 풀려 국물이 걸쭉하다. 취재팀은 담박한 쪽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어쨌든 개인의 호오(好惡) 문제일 뿐이다.
곁들임으로 밥을 조금 담아 내오는 것은 좋았다. 그러나 국물 맛에 조미된 맛이 강해서 썩 흔쾌하지 않았다. 주방 안으로 끓는 국물을 퍼 담는 플라스틱 국자가 보이는 것도 감점 요인. 플라스틱의 내열 온도가 100℃가 넘는다 하더라도 뜨거운 음식을 조리할 때 플라스틱 조리도구는 권장 사항이 아니다. 깍두기도 너무 신맛이 났다.
체부동(경복궁역 근처)의 ‘토속촌’은 노무현 대통령이 즐겨 찾는다 하여 유명세를 탔으나, 본래 그 이전부터 유명한 집이었다. 특히 국물이 맑은 편인 보통 삼계탕과 달리 밤과 콩 같은 곡물을 갈아 넣어 진한 맛이 특징이다. 이것 역시 호오가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는 스타일이지만, 특별히 싫다고 할 이유는 없을 터.
깍두기 맛도 좋고 사람들이 워낙 몰리는 계절에 따른 서비스의 불안은 어느 정도 접어주고 갈 수도 있겠다. 다만 엄청나게 넓은 홀(앉은뱅이 좌석만 있어서 안 그래도 넓은 홀이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다. 보통 좌식과 입식 탁자의 수용 인원은 두 배 차이로 본다)을 감당하기에는 주방이 아주 좁다. 단품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귀찜 등도 하기 때문에 주방의 크기가 더 커야 할 텐데 말이다.
좁은 주방에 많은 요리사(대개 중년 여성)들이 일하다 보니 들여다보이는 내부가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다. 식품 위생을 따질 때 공간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인이다. 하지만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을 했는데, 비교 시식을 하느라 삼계탕을 많이 남기고 자리를 뜨자 직원이 식당 밖 한참 먼 거리까지 쫓아와 음식을 싸가지고 가겠느냐고 물었다. 장안의 뚝배기 값을 올리는 식당치고 이런 자상한 서비스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 유쾌했다.
서소문의 ‘고려삼계탕’은 리노베이션을 한 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이 차를 대놓고 식사를 하느라 식당 앞이 늘 부산하다. 삼계탕이 어느덧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 된 모양이다. 이 집 삼계탕은 딱 삼계탕 맛이다. 그래서 좋다.
장안삼계탕의 간결한 맛과 흡사하다. 오래 전 그 맛일 게다. 닭도 쫄깃하고 국물도 깔끔하다. 깍두기도 맛이 좋다. 그러나 1인분에 담아 내오는 깍두기와 김치 양이 너무 많으면 의심을 살 수 있다. 재활용하지 않는다면 적당한 양만 담아내는 게 자원도 절약하고 의심받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다.
< 출처 : http://blog.empas.com/zinzin/read.html?a=222455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