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올레폰안심플랜'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줬던 사례와 비교해 애플 케어 플러스에도 동일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애플 케어 플러스를 보험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던 국세청은 최근 약관 개정에 따라 상품의 성격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고, 금융위도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상황이 변화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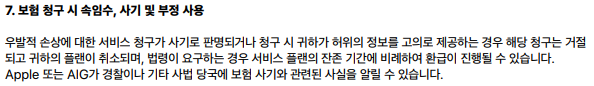
지난 18일 애플코리아는 개정된 애플 케어 플러스 이용 약관을 고지했다. 해당 약관에서는 7항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됐고 ‘Apple 또는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개정된 약관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보험상품임을 시인한 셈이다.
애플 케어 플러스는 애플사가 판매하는 매킨토시 컴퓨터나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기기의 서비스기간을 연장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소비자 과실로 인해 파손되어도 자기 부담금을 내면 가입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9년부터 애플코리아는 애플 케어 플러스가 보험상품이 아닌 통합 서비스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회의원이 애플 케어 플러스는 보험상품이라며 소비자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라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지난 2016년 KT의 ‘올레폰안심플랜’ 사례가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KT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가입자 988만 명에게 평균 6100원씩 모두 606억 원을 환급한 바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통해 애플 케어 플러스가 서비스 상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KT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애플이 유권해석을 요청했을 때는 보험상품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며 “우발적 손상과 관련된 수리 서비스는 통합 서비스 중 일부에 불과하고 애플이 직접 수리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 올레폰안심플랜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왔던 사례”라면서 “금융위에서 애플 케어 플러스의 성격을 명확하게 따져주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이 판단한 바는 서비스 상품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애플이 유권해석 요청을 다시 한다면 (약관에 보험사기 등을 규정한 상황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다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권해석 변경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굳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유권해석 요청은 가능하다”면서 “애플 케어 플러스와 관련해 정식으로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애플을 국감에 소환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 등 정부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