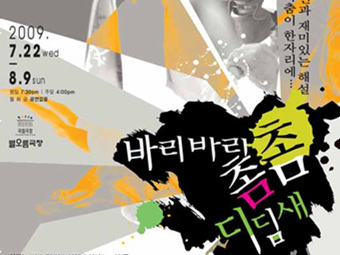김남용의 ‘거울의 방’은 그 거울을 통해 인간의 감춰진 모습 드러내기를 시도한다. 이미 많은 대중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했을 인간 본연의 문제를 연출가 김남용은 무용을 통해 보여줬다. 세상을 비추는 거울과 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 짧은 시간 동안 안무로 표현됐다.
- 무대소품에 의미의 입체성이 듬뿍! 사과, 거울, 무덤
‘거울의 방’에서 사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과의 유혹적인 붉은 빛깔,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양면성을 지닌 맛은 선악과의 상징성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사과는 욕망의 집합체이자 욕망을 깨우는 매개체이다.
거울은 자신의 숨겨진 자아와 마주보게 하는 도구다.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은 실존하는 ‘나’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거울은 무대 안과 밖(관객)에게 투영된다.
톱밥으로 세워진 무덤은 삶과 죽음의 순환적 의미를 드러낸다. 남자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서 태어난다. ‘무덤에서 탄생’이라는 인간의 근원을 뫼비우스띠처럼 잘 표현했다.
- 거울 속 ‘나’와 또 다른 ‘나’, 4개의 자아
거울을 통해 깨어난 부정적 자아(나태, 정욕, 교만, 분노)는 여자들을 통해 표출된다. 여성의 가는 선이 만들어내는 욕망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다. 남자와 욕망의 엇갈리는 몸짓은 의지대로 되지 않는 자아의 꿈틀거림을 보여준다.
태어난 무덤으로 돌아가는 순간 인간의 육체 위에 순백의 흰 천이 덮여진다. 쓰러진 남자를 덮은 흰 천위로 붉은 생명의 핏방울이 떨어지며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 그렇게 태어난 새 생명 또한 거울을 볼 것이다.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굴레가 계속 된다.
이렇듯 김남용은 ‘거울의 방’을 통해 자아의 갈등과 자크 데리다의 바이러스행렬같은 근원의 불규칙성을 심도 있게 표현했다.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 뉴스테이지=이영경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