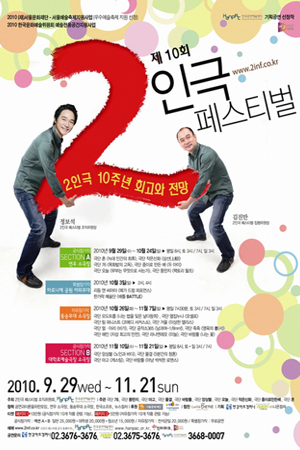숫자 ‘2’는 쌍둥이, 파트너와 같은 화합을 의미하는 동시에 대립과 갈등 등 분리의 의미를 갖는다. 짝수의 기원으로 화해와 갈등이 출발, 공존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숫자 ‘2’는 각별하다. 2인극은 연극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다. 그 안에서 더욱 치밀하게 응축된 인간군상을 보여준다. 인간의 심연을 분석하는 차원에서는 통계만큼이나 뿌리 깊게 관통한다. 무대가 점차 상업화, 대형화 되고 있다. 2인극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는 듯 보인다. 연극 ‘목화밭의 고독 속에서’, ‘두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연극의 움직임과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두 연극이 관객들에게 묻는다.
- 연극 ‘목화밭의 고독 속에서’
인간본질에 대한 철학적, 문학적 사유
어둠속에서 두 인간군상이 얼굴을 드러낸다. 강렬한 조명아래 냉혈적인 무표정의 두 인간군상이 마주한다. 침착성을 잃지 않은 말투로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린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를 주시하며 둥근 제로를 그린다. 이 둘의 대결구조는 인간의 본질과 욕망을 꿰뚫는 철학적이고 비장한 언어들로 점차 심화된다. 그들은 ‘파는 자’와 ‘사는 자’이다. ‘파는 자’는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포장해 자신과 ‘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는 자’의 마음을 유도하려 한다. ‘사는 자’는 ‘파는 자’를 믿지 못한다. ‘사는 자’ 역시 ‘파는 자’의 심리와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두터운 방패막을 친다. 이들의 팽팽한 싸움은 일사천리로 이어진다. 작품은 이처럼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눠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싸움의 원인도 이해관계 혹 물질이기보다 심연의 본질적 욕구에 가깝다.
연극 ‘목화밭의 고독 속에서’는 가능한 모든 액션과 무대장치는 배제하고 텍스트에만 집중했다. 난해하고 철학적이며 비약적인 언어의 나열은 작가의 천재성을 재차 확인케 한다. 텍스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연극적 장치들을 최소화했던 연출의 의도는 일리가 있다. 관객은 다의적이고 모호한 언어의 홍수에서 의미에 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극은 모두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중 몇 가지만 이해해도 마음에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다. 연극은 ‘사랑은 없다’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그들은 스스로 둥근 제로를 유지하며 선을 긋는다. 연극 ‘목화밭의 고독 속에서’는 이 시대의 뿌리 깊은 불신을 잔혹할 정도로 꾸밈없이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
- 연극 ‘두 아이’
그렇다면 과연 ‘너’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구분 못하는 꼭 닮은 딸이 나타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극 ‘두 아이’는 엉뚱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연극은 독특한 미장센과 우스꽝스러운 연기로 관객에게 담백하게 다가가지만 실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부부는 진짜를 가리기 위해 좌충우돌한다. 부부에게서 오가는 솔직담백한 대화들은 섬뜩할 정도로 인간의 본질, 왜곡되고 부조리한 세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연극 ‘두 아이’에서 두 아이는 볼 수 없다. 엄마가 작은 유아놀이차 둘을 힘겹게 밀고 나오는 것으로 관객은 두 아이가 타고 있고, 그들이 그녀의 자녀임을 예상할 뿐이다. 부부의 마임과 같은 행동을 통해 관객들이 상상하는 두 아이는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이처럼 ‘두 아이’라는 소재는 물론이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치들로 풍부하다. 흔히 상상은 낯설음에서 시작된다. 연극 ‘두 아이’에서 부부는 전화박스가 자리한 벤치에서 생활한다. 잠옷을 입은 채로 자연스럽게 공중전화로 통화하고 대화하는 모습은 낯설고도 재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