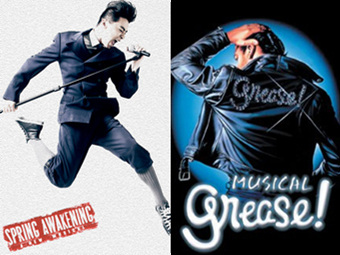팔다리 잘린 자유, ‘스프링 어웨이크닝’
무대 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경직된 채 교사의 눈치를 보며 앉아 있다. 권위에 억눌려 있던 학생들이 자신의 품에서 마이크를 꺼낸다. 말할 수 없었던 욕망을 품안에서 꺼낸 마이크에 대고 외친다. 19세기 말, ‘스프링 어웨이크닝’이 바라본 십대의 모습이다. 그들과 어른들 사이에는 어찌할 수 없는 경계선이 있다. 어른들은 그 경계의 이탈을 죄악시 한다. 그렇기에 십대란 어둡고 무지하며 갇혀있다. 무지는 폭력을 낳고 어른들은 손끝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자녀들을 죽인다.
팔다리 묶인 십대들의 노래와 춤은 자유롭지 못하며 억제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만이 내뿜을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 반복되는 질문과 요구에 대한 거부, 어른들을 향한 조롱은 ‘스프링 어웨이크닝’ 전체를 압도하는 에너지를 발산시킨다.
내가 원하는 것만 중요하다, ‘그리스’
이제 시간이 흘러 20세기 중반이다. 여기 미국의 10대들이 모여 ‘그리스’를 이룬다. 역시 반항적이며 자유를 갈망한다. 그러나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분위기와는 다르다. 무대 위에는 종일 부자연스럽게 앉아 있어야 하는 나무 의자 대신, 개성에 맞게 폐차를 개조한 ‘그리스 라이팅’이 있다. 분노의 폭발을 주체하지 못한 춤 대신 열정을 즐기는 댄스가 있다. 억압하는 부모나 선생은 등장하지 않고 이성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남 자체를 지나 관계에 대해 고민하며 좌절한다. 경찰이 올 때는 공부하는 척 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에 열광하던 시대다.
교복을 벗고 청바지를 입는다
‘스프링 어웨이크닝’이 불편한 교복을 입고 있다면 ‘그리스’는 화려한 청재킷과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다. 시대적 배경을 지나 10대를 바라보는 두 뮤지컬의 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둘의 공통적 사건인 ‘임신’은 과정과 결과의 차이가 양극으로 치닫는다.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벤들라’는 아무런 지식과 의심 없이 임신을 하게 된다. 그녀는 다만 ‘안고 싶었고 함께 있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리스’의 ‘리조’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결국 ‘벤들라’는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리조’는 이해하므로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인 19세기의 독일과 달리, 20세기 초 미국의 십대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신들이었다. 여기에서 더 지나 뮤지컬 ‘렌트’에 이르면 상황은 또 변한다. 20세기 말, ‘렌트’의 고민은 예술과 동거, 생계 문제로 뛰어 넘는다.
십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색과 모양이 다르다. ‘스프링 어웨이크닝’ ‘그리스’ 모두 십대들의 사랑과 열정, 자유를 그리고 있다. 그들이 펼치는 춤과 노래는 자신들만의 개성적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 빛깔은 다를지라도 객석을 집중시킬만한 강렬함이 있다. 지나버린 십대의 열정이 그립다면 멀지 않은 곳에서 공연되는 두 뮤지컬을 비교 관람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2009. 6. 30 ~ 2010. 1. 10,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뮤지컬 ‘그리스’, 2009. 4. 4 ~ OPEN RUN,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뉴스테이지=이영경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